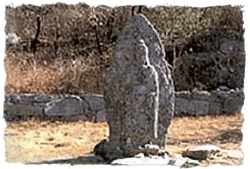
<달성용봉동 석불입상>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35호 지정년도 : 1979년 1월25일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2-1 신라 하대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고 280cm, 상고 190cm 규모를 가진다. 비슬산 일원에는 신라시대 이래의 많은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는데 용봉동 석불입상이 있는 곳도 그 중의 하나로서 석불과 기와조각만이 산재할 뿐 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석불은 판석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한쪽면에 광배와 양각의 서있는 불상을 조성했던 것으로서 왼손에 약호를 든 약사여래이다. 불상은 약식화된 연화대 위에 조각한 것으로 하부의 표현은 빈약하나 머리는 소발에 큼직한 상투 모양의 육계가 있는 풍만한 상호가 나타나 있다. 양 어깨에 모두 옷을 걸친 통견의 법의를 입고 있다. 주형광배는 원형의 두광과 가는 타원상의 신광을 도드라진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불상과 광배의 이러한 조성기법은 통일신라 하대의 수법을 계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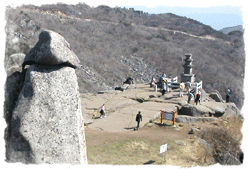
<대견사지>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 42호
지정년도 : 1994년 4월 16일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 1
비슬산 주봉에서 남쪽으로 약 2km 해발 1,000여m에 위치한 이 탑은 중국 당나라의 황제가 절을 짓기 위하여 찾아 헤메다 9세기 신라 헌덕왕때 이곳 비슬산에 절과 삼층석탑을 건립하고 대국에서 본 절이라하여 대견사라 이름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절은 임란때 허물어져 버리고 빈터에 주춧돌과 석축만이 남아있으며 삼층석탑도 허물어져 있는 것을 달성군에서 1988년도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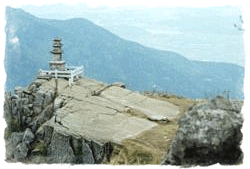
<대견사지 삼층석탑>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 42호
지정년도 : 1994년 4월 16일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 1
비슬산 주봉에서 남쪽으로 약 2km 해발 1,000여m에 위치한 이 탑은 중국 당나라의 황제가 절을 짓기 위하여 찾아 헤메다 9세기 신라 헌덕왕때 이곳 비슬산에 절과 삼층석탑을 건립하고 대국에서 본 절이라하여 대견사라 이름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절은 임란때 허물어져 버리고 빈터에 주춧돌과 석축만이 남아있으며 삼층석탑도 허물어져 있는 것을 달성군에서 1988년도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성암 삼층석탑>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
유가면 양리 유가사 도성암 극락전 앞에 위치하며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
<도성암 삼층석탑>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
유가면 양리 유가사 도성암 극락전 앞에 위치하며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
높이 218cm , 기단의폭 184cm, 하대지석과 중석이 일석이며 탱석이 1개있고 하대갑석은 2개로 구성, 몰딩이 2개 있으며 상대중석이 4개로 구성되었고 탱주가 있다
갑석부연이 있고 3층 이상은 옥신, 옥개, 두부가 없다

<비슬산 암괴류>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435호
지정년도 : 2003년 12월 5일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 일원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8만년전 지구상에는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후는 빙하 기후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빙하 기후대에 해당되며, 비슬산 암괴류는 이때 형성된 지형이다.
본 암괴류는 길이 약2㎞, 폭80M, 사면경사 15°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암괴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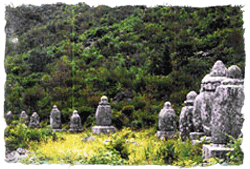
<유가사 부도>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
유가면 양리 유가사 서북쪽 200m 지점에 소재한다. 대부분이 각종 형태의 기단에 종형의 탑신을 올린 양식으로 조선조 후기의 것이다.
탑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낙암당대 사지탑/월호탑/휴영당대사/정암당설청대사/도봉당해백대사/관월당경수대사/동파당진흘대사/규악당명학대사/설곡당처명대사/노곡당사옥대사/봉일당영규대사/청심당도경대사/유허당풍열대사/취성당하초대사/백연당세민대사)

<유가사 삼층석탑>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 144
높이 364cm, 상대갑석 폭 138cm, 유가사에서 500m 서북 지점에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폐사가 되고 탑재가 흩어져 있는 것을 1920년경 유가사 대웅전 앞으로 이전, 당시 탑의 두부 및 삼층옥신 상대중석이하를 새로 조성하였고 하대갑석은 몰딩이 없으며 하대갑석 이하는 없다.

<유가사 석조여래좌상>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50호
지정년도 : 2003년 4월 30일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144
이 불상은 불상과 대좌가 모두 같은 석질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것으로 얼굴 전면과 양 무릎을 시멘트로 보수하였으나 그 외의 부분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머리는 작은 소라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정수리 부근에는 사투모양의 머리인 육계가 높이 솟아 있다. 얼굴 모양은 갸름한 달걀형으로 삼도(三道)는 뚜렷하지 않다. 어깨는 각이 지고 힘이 들어가 있으며 가슴은 양감 있게 돌출되었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을 감싼 우견편단으로 상반신은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크게 열었다. 손모양은 항마촉지인을 결하였는데 왼손은 오른발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결가부좌한 다리에는 법의(法衣) 주림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불상은 형태 면에서 석굴암 본존상과 같은 계열의 불상으로 볼 수 있으나 불상의 어깨가 좁아지고 가슴의 탄력이 감소되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대좌도 방형으로서 10세기 이후의 유행을 반영한 것으로 이 불상의 연대를 추정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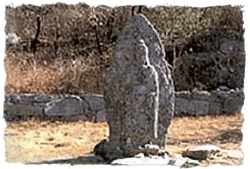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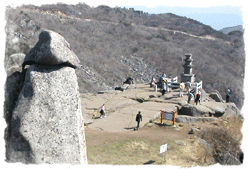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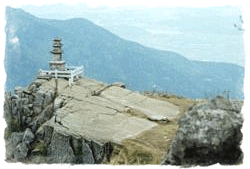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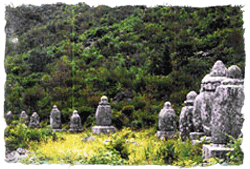


0개 댓글